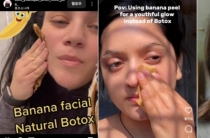최근 대통령 후보 모 인사가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는 것, 그것이 북한의 시스템”이라는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국민의 삶에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 중 하나였으며, 최근에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현행 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책임은 가족과 같은 보호의무자가 져야 한다. 얼마 전 정신장애인이 집에 불을 질러 옆집까지 탔을 경우 보호의무자인 아버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인 아들의 보호의무자는 이런 우발적 행동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어,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논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행과 같이 오롯이 가족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2018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는 ‘보호의무자의 의무’로서,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유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의사에 반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의 형태가 된다. 이것이 보호자의 책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강제입원은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보호자를 원망하거나 심한 경우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신질환자의 가족 대부분은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없애달라고 주장한다.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공적인 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결정해야만 나중에 환자가 보호자를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신질환에 의한 중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환자를 돌보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보호자에게 있지만 환자의 증상이 심하게 악화될 경우 이를 통제하기가 힘들어 경찰이나 소방서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정신응급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치료 단계마다 보호의무자가 관련해야 한다. 이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가족으로서의 고통과 부담, 감정적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장기간 약물 복용이나 치료에 있어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결국 가족 붕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국민의식은 많이 바뀌고 있다. 1998년 우리나라 국민 90%가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했지만 2016년에는 절반 이상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이의 가족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사회가 나서서 환자를 책임지는 것이 변화하는 사회 추세에 부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가족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